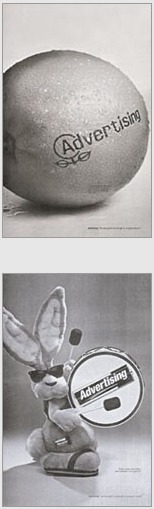돌아올 날이 되어서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며칠째 나는 여행중이었고, 아무런 잡념 없이 그저 여행에만 전념하리라던 내 애초의 생각이 허물어진 것은 ‘광고’에 대한 원고청탁 건이 생각나서였다. 대체 내가 광고에 대해 무얼 안다고. 그쪽에 대해선 전혀 일자무식이던 내가 그 원고청탁을 수락한 것부터가 어쩌면 잘못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던 내 눈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함께 해안선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숲이 들어왔다. 그 솔숲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숲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살까 벌목을 할까, 아니면 저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숲은 이미 숲이 아니라고. 그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의욕이나 사업에 관련된 ‘숲이라는 상품’에 불과하다고. 때문에 거기엔 어떤 나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형은 어떠하고 또는 나무들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들만 보이게 되지 않겠는가.
광고란 것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상품의 본질과는 별개인 현란한 포장에 주력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진면목을 나타내는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숲을 광고할 때, 그것이 가진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면 그것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이다. 예컨대, 자연 그대로의 푸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그 속에서 해가 뜨고 노을이 지며 새들이 날아들어 거침없이 지저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숲은 그 존재가치가 충분할 터라는 것이다.
요즘은 정말 넘치는 세상이다. 넘쳐 흐른다는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 풍요롭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많다면 오히려 쓸쓸해지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풍요 로워지면 정신은 그만큼 비좁아진다.
우리 마음에 온갖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데 정신이 들어설 틈이 어디 있는가. 물건의 홍수에 더불은 광고의 홍수. 나는 가끔 짜증이 난다. 알맹이는 빠드리고 겉치레만 번드레한 광고를 접할 때면. 이럴 때 나는 하인리히 뵐(Heinrich Boll)이 쓴 소설<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소설이 생각났다. 주인공인 ‘캐테 ’라는 아가씨에게 젊은 청년 ‘프레드’는 이렇게 청혼한다.
“나는 일생동안 나와 함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짧고 기지에 찬 몇 마디의 말 때문에 캐테의 일생은 크게 뒤바뀌게 된다. 그때까지 별 관심이 없었던 프레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엔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 한 마디에 감동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일생이 변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그런 광고가 어디 없을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따스해지게 하는 그런 광고. 하기사, 이 소란스러운 시대에 그런 광고를 바라는 것은 나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런지.
'Archive > Webzine 200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1/03-04 : 우리 모델 최고!-이영애, 이승연, 전지현 - 똑똑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세 미녀와 엘라스틴 (0) | 2010.08.04 |
|---|---|
| 2001/03-04 : 최신 해외 명작광고 - 광고는 브랜드를 키우고, 브랜드는 광고를 키웁니다 (0) | 2010.08.04 |
| 2001/03-04 : 광고와 문화 - 가벼움을 넘어 오늘을 사유함! (0) | 2010.08.04 |
| 2001/01-02 : New sighting - 상상의 눈 (0) | 2010.08.04 |
| 2001/01-02 : Special edition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타깃으로서의 Single - 싱글(Single)의 정글(Jungle) 속으로 현미경을 (0) | 2010.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