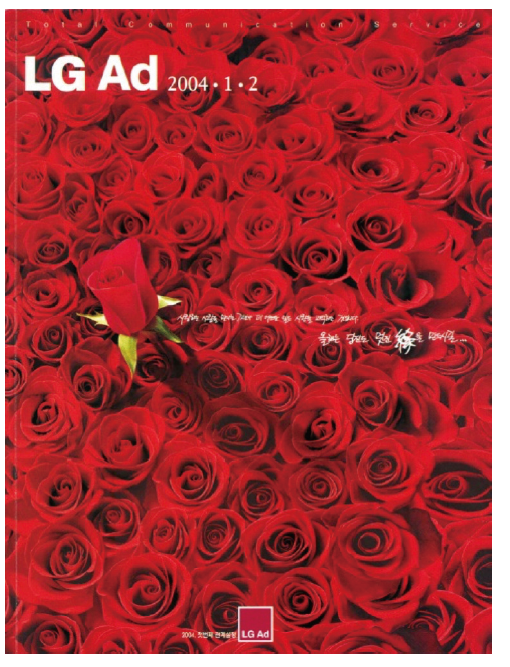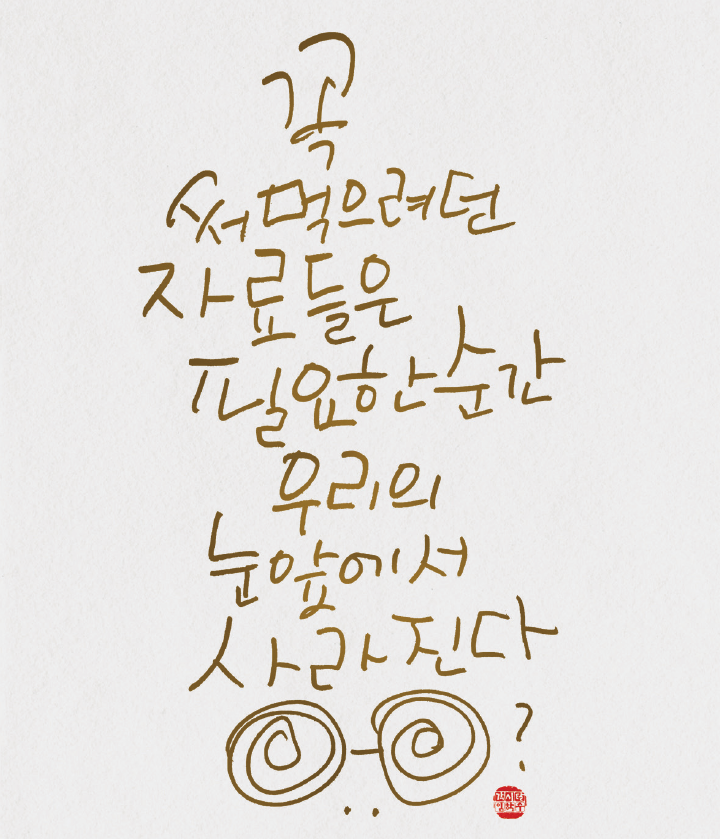이해받지 못한 자의 슬픔
- 이윤기 감독에 대한 작가주의론
Film : 우리들의 판타지아
이 재 호
20여 년 전, <애정만세(Vive l'amour)>라는 영화가 있었다. 대만 감독의 영화인데, 그다지 크게 흥행하진 못했지만 영화를 좋아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리 없이 유명했던 작품이다. 영화 제목은 왠지 청춘들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듯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정반대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영화랄까. 영화는 일단 이야기가 없고 대사도 거의 없다. 주인공들은 우연히 스쳐가지만, 그저 우연일 뿐이고 그야말로‘ 스쳐’간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여주인공이 공원 벤치에 앉아 우는 마지막 장면인데,
놀라운 것은 카메라가 미동도 하지 않고 원숏으로 17분가량 이어진다는 점이다(너무나 놀라워서 직접 시간을 재봤던 기억이 난다). 17분. 카메라는 멈춰있고, 여자는 아무런 대사 없이, 특정한 이유 없이 그저 운다. 아마도 소외된 그들의 삶을 표현하기엔 이런 방식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겪는 소외감에 구체적인 이유를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실에 가깝지 않다.
현대인의 고독을 말하는 감독, 이윤기
이윤기 감독의 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보며 <애정만세>가 떠올랐다. 이 영화 역시 제목만 보고 뚜껑을 열어보면 무지하니 실망할 영화다. 현빈과 임수정 주연이라는 양념도 별반 소용 없다. 사실 누가 배우였던들 상관이 없을 법한 영화라고나 할까. 영화는 유난히 한 숏한 숏이 길다. 공간을 의미 없이 3~4초가량 비춰준다거나, 주인공들이 배회하는 동선을 그저 따라가 보여준다거나, 요리 프로그램도 아닌데 면을 끓이고 마늘·호박·가지 볶는 장면을 물끄러미 실시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전혀 해피하지 않은, 결국 영화의 시작과 다를 바 없는 공허한 결말.
감독의 최신작 <남과 여> 또한 마찬가지다. 불륜이라는 소재, 정통 로맨스라는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작보다는 대중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역시 대단히 느린 전개에 대단히 허망한 결말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멜로드라마를 보는 이유, 욕망에 대한 해소를 전혀 해주지 않은 채 오히려 멜로드라마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까.
멜로드라마의 형식을 취하면서 멜로드라마와 거리를 둔다니, 이 정도 되면 관객들은 농락당했다는, 배신감마저 들게 마련이다. 흥행 실패라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토록이나 관객을 배반하는 영화를 보는 건 아주 오랜만의 경험이다. 왠지 이질적이었지만 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아주 단순하다. 감독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주목한 주제에 대해. 그리고 그 주제란 좀처럼 사람들이 다루길 꺼려하는 그 현실, 현대인의 고독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 특별히 고독을 더더욱 체감하게 하는 시대적 정서가 있으니, 바로 이윤기 감독이 말하는‘ 몰이해’다.
의도된 거리두기의 제스처, 배려
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보면, 이혼을 앞둔 두 주인공은 서로를 극진히 배려한다. 헤어짐을 앞둔 부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과도한 배려다. 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걸까.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에 더 이상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제스처와도 같다. 마치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그것은 상대를 그만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안간힘이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으니 날 다치게 하지 말라는 사인이다. 영화 속 부부가 그러하다.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을 상대에 대한 과도한 배려 - 거리두기를 통해 지키려는 것이다. 결국 그 배려가 오히려 서로를 소외시키는 태도가 된다. 배려는 그들 사이의 거대한 벽이 된다.
부부가 이렇게나 서로 거리를 두고 벽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관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버린 단절된 상황이다. 영화는 90분 내내 그 배려를 통한 거리두기만을 아주 건조한 시선으로, 아주 느리고 답답하게 보여준다. 긴- 원 숏이라는 영화적 형식은 그런 그들의 거리감을 관객들 또한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내내 답답하고 지루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쩌면 감독이 의도한 바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숨 막힐 듯한 거리를 아내가 단 한 번 뚫고 나온 순간이 있다. 그 순간 아내 영신(임수정 분)이 뱉는 대사는 이렇다.
“바람나서 헤어지자는 아내에게 그렇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몰라?”
사실, 영화에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 아내의‘ 바람’이라는 계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그 상대가 누군지 어떻게 바람이 났는지는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 예의를 차려야만 할 정도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 거리는 서로에 대한 의도된 ‘몰이해’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통로에 빗장을 걸어 잠근 그들.
그들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는 박탈감
이윤기 감독의 좀 더 최근 영화 <남과 여>를 보자. 줄거리는 아주 흔한 로맨스의 정석, 불륜의 이야기다. 낯선 이국땅에서 만난 유부남 유부녀가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와 다시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는….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갈구했던 욕망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감독은 남과 여의 사랑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 영화는 불륜의 로맨스라는 화려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 얼굴은 갇혀버린 삶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가령 두 주인공이 처한 삶의 환경 자체에서 그 실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과 아내를 둔 남자, 자폐 아들과 무관심한 남편을 둔 여자. 그들의 삶이 어떠하리란 건 대략 상황만 미루어보아도 알 수 있다.
힘겨운 상황에 놓인 둘은 그런 일상의 탈출구로 서로를 찾는다. 하지만 서로는 서로에게 탈출구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서로는 서로가 왜 서로를 찾는지 한 번도 공감하지 않는다. 그저 일상을 마주하기 힘들 때 서로를 찾을 뿐. 이런 것이 사랑인가 아닌가 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다. 내가 힘겨울 때 다가온 사람에게 품는 감정이라 하여 사랑이 아니라 할 것도 없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랑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가족들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는, 좌절된 갈망. 그건 지독한 외로움이며, 그 외로움의 원인은 이해받지 못함 - ‘몰이해’다. 오히려 그들은 타인이 된 가족을 이해하고 감내해야만 하는 책임자의 역할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위태로울 뿐더러, 무엇보다 지독하게 외롭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힘겹게 하는 건 단지 홀로 있음이 아니다.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오는 박탈감, 그것이 그들을 고독의 끝으로 몰아간다. 영화 속, 남자의 아내는 우울증과 씨름하면서 남자에게 말한다.
“당신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 말을 듣는 남자의 표정은 쓸쓸하고 건조하다. 바로 이윤기 감독의 영화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지배적인 정서다. 그 쓸쓸함과 건조함의 뒤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다. ‘그래 난 네 마음을 잘 몰라. 하지만 너도 내 마음을 잘 아는 건 아니잖아?’
결국 몰이해는 고독을 낳고, 고독은 다시 몰이해를 낳는다. 현대인들이 갇힌 폐쇄된 관계의 순환구조이다. 참으로 답답하지만 탈출하기 어려운.
'Archive > Webzine 2016'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09-10 : 마지막 인쇄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위한 송가 (0) | 2016.09.27 |
|---|---|
| 2016/09-10 : 클레멘타인 케이크 (0) | 2016.09.27 |
| 2016/09-10 : 광고회사에 다니면 비로소 알게되는 것들 (0) | 2016.09.27 |
| 2016/09-10 : LooksGood-DIGITAL (0) | 2016.09.27 |
| 2016/09-10 : LooksGood-PRINT (0) | 201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