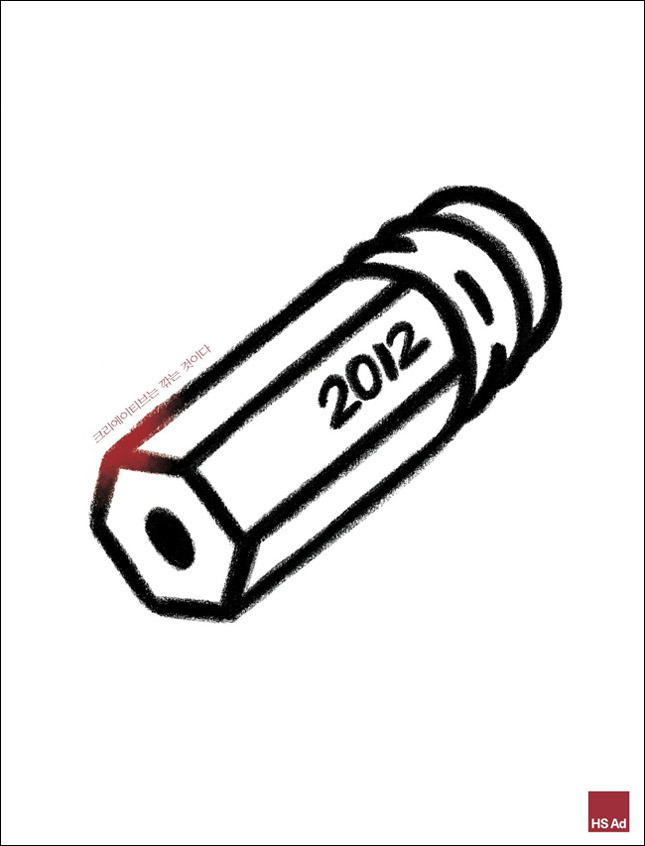WiseBell
사소한 너무나 사소한
유배 혹은 망명생활과 글쓰기
9.11이 일어났던 그 해 난 우연히 뉴욕에 있었다. 정확히 말해 숙식은 뉴저지에서 했고, 버스를 타고 링컨터널을 지나 맨해튼 21번가에 있는 학교로 매일 배달되어지는 학생이었다. 회사는 큰돈을 들여 마흔 살에 애 둘 딸린, 그리고 영어는 ‘그냥 웃지요’ 정도 수준의 사내를 뉴욕에 보내 4개월간의 학창생활을 만끽하게 했다.
하지만 JFK공항에 도착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버렸고, 그 바람에 뉴욕은 공황 상태가 됐다. 난 고원무립, 한 달여 동안 맨해튼엔 얼씬도 못하게 됐다. 학교는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실직고하자면 수업은 한 달쯤 후에 재개됐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오전 수업은 첼시에서 점심은 유니온 스퀘어에서 오후 수업은 이스트 빌리지에서, 어떤 날은 브롱스빌이나 브루클린으로 싸다니며 영혼충전에만 몰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꽤 있어 보이는데`-`주인공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배경은 화보 맞다`-`행색이 영락없는 떠돌이 시주승 꼴이었다.
그러기를 두어 달 남짓, 나의 문화적 망명생활은 뜻하지않은 복병을 맞이했다. 생면부지 땅에서의 계속되는 시주승 생활은 감동이 잦아들면서 무인도에서의 유배 생활과 별 차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것도 영어라는 도구가 서바이벌 수단이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안 되는 나로서는 고독 혹은 고립감의 무게가 점점 버거워짐을 느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도 썼고 여행기도 썼고 심지어는 뉴욕 골목골목의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귀국 후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때 참 호사했다는 핀잔만 들었지만`-`나름 고립감을 잊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이야기 상대가 그리워졌다. 아니 말 자체가 그리워졌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다. 어떤 모임이든 모임이라면 생리적으로 싫어하던 나 같은 인간에게 말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거나 멋진 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오히려 다리 긁적대며 해대는 하등에 무의미한 농담들이나, 허접하고 시시껄렁한 잉여적 표현들 혹은 실없는 수다 같은 것들이었다.
그렇게 하찮고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다.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친한 사이란 말 같지도 않은 사소한 말들을 아무런 격의 없이 낄낄대며 해대는 사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이란 논리의 교환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교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한 소통이란 감정의 모든 부스러기까지 교감할 때 오르가즘에 이른다.
생각해보면 한마디 말도 어휘의 선택부터 어투·어조·억양·강약·타이밍·눈의 위치·손의 동작들에 따라 느낌이 다른 법이다. 그래서 난 휴대전화로 나누는 문자 커뮤니케이션이 늘 불편하다. 상황적 편의성이나 도구적 실용성은 인정하나 생물로서의 인간보다는 기계로서의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 못마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기계가 정리해준 몇 안 되는 이모티콘으로 우리의 감정을 정리세일당하는 기분은 왠지 무섭기까지 하다.
바람에 풀잎처럼 일어나는 감정들을 맡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다.
이현종
CCO(Chief Creative Officer) | jjongcd@hsad.co.kr
사소한 너무나 사소한
유배 혹은 망명생활과 글쓰기
9.11이 일어났던 그 해 난 우연히 뉴욕에 있었다. 정확히 말해 숙식은 뉴저지에서 했고, 버스를 타고 링컨터널을 지나 맨해튼 21번가에 있는 학교로 매일 배달되어지는 학생이었다. 회사는 큰돈을 들여 마흔 살에 애 둘 딸린, 그리고 영어는 ‘그냥 웃지요’ 정도 수준의 사내를 뉴욕에 보내 4개월간의 학창생활을 만끽하게 했다.
하지만 JFK공항에 도착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버렸고, 그 바람에 뉴욕은 공황 상태가 됐다. 난 고원무립, 한 달여 동안 맨해튼엔 얼씬도 못하게 됐다. 학교는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실직고하자면 수업은 한 달쯤 후에 재개됐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오전 수업은 첼시에서 점심은 유니온 스퀘어에서 오후 수업은 이스트 빌리지에서, 어떤 날은 브롱스빌이나 브루클린으로 싸다니며 영혼충전에만 몰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꽤 있어 보이는데`-`주인공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배경은 화보 맞다`-`행색이 영락없는 떠돌이 시주승 꼴이었다.
그러기를 두어 달 남짓, 나의 문화적 망명생활은 뜻하지않은 복병을 맞이했다. 생면부지 땅에서의 계속되는 시주승 생활은 감동이 잦아들면서 무인도에서의 유배 생활과 별 차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것도 영어라는 도구가 서바이벌 수단이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안 되는 나로서는 고독 혹은 고립감의 무게가 점점 버거워짐을 느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도 썼고 여행기도 썼고 심지어는 뉴욕 골목골목의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귀국 후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때 참 호사했다는 핀잔만 들었지만`-`나름 고립감을 잊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이야기 상대가 그리워졌다. 아니 말 자체가 그리워졌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다. 어떤 모임이든 모임이라면 생리적으로 싫어하던 나 같은 인간에게 말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거나 멋진 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오히려 다리 긁적대며 해대는 하등에 무의미한 농담들이나, 허접하고 시시껄렁한 잉여적 표현들 혹은 실없는 수다 같은 것들이었다.
그렇게 하찮고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다.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친한 사이란 말 같지도 않은 사소한 말들을 아무런 격의 없이 낄낄대며 해대는 사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이란 논리의 교환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교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한 소통이란 감정의 모든 부스러기까지 교감할 때 오르가즘에 이른다.
생각해보면 한마디 말도 어휘의 선택부터 어투·어조·억양·강약·타이밍·눈의 위치·손의 동작들에 따라 느낌이 다른 법이다. 그래서 난 휴대전화로 나누는 문자 커뮤니케이션이 늘 불편하다. 상황적 편의성이나 도구적 실용성은 인정하나 생물로서의 인간보다는 기계로서의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 못마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기계가 정리해준 몇 안 되는 이모티콘으로 우리의 감정을 정리세일당하는 기분은 왠지 무섭기까지 하다.
바람에 풀잎처럼 일어나는 감정들을 맡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다.
이현종
CCO(Chief Creative Officer) | jjongcd@hsad.co.kr
'Archive > Webzine 201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2/01-02 : ‘緣’想同感 (0) | 2012.02.09 |
|---|---|
| 2012/01-02 : CEO 신년사 (0) | 2012.02.09 |
| 2012/01-02 : HSAd Close-up - 패션 넘버6, 이종호 CD팀 우리가 바로 스타일 (0) | 2012.02.08 |
| 2012/01-02 : OBLOUNGE - "밤샘도 즐거웠던 LG애드 여전사…" (0) | 2012.02.08 |
| 2012/01-02 : 세상 낯설게 보기 - 2012년엔 ‘龍頭龍尾’하시길! (0) | 2012.02.08 |